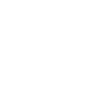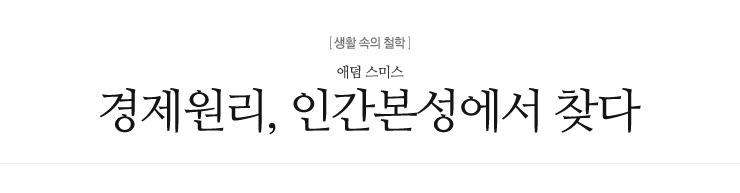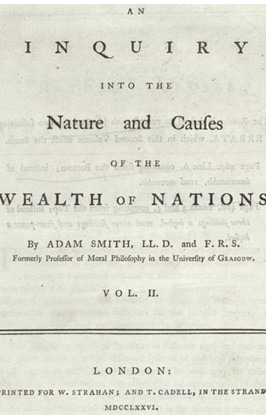따지고 보면 [도덕 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도 그렇다. 이 책은 인간 본성 또는 도덕 감정에 대해 집요하게 추적해온 스코틀랜드 계몽시대의 도덕철학자들의 성찰을 토대로 한다. 슘페터 식 어법으로 좀 용감하게 말하면, 전체의 틀은 스미스의 스승인 프랜시스 허치슨(Francis Hutcheson: 1694-1746)에서 가져왔고, [도덕감정론]의 핵심 개념인 ‘공감(sympathy)’의 원리는 그의 친구인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1776)의 용어를 빌려왔다. 인간의 이기심(self-interest)이 공감의 원리와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구성의 원리로 작동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를 가져온다는 결론은 어떤 점에서는 그가 평생을 두고 비판해온 버나드 맨더빌(Bernard Mandeville: 1670-1733)의 “개개인의 부도덕이 공공선을 만든다”는 주장과 역설적으로 일치한다. 스미스는 그보다 앞선 도덕철학자들의 주장을 잘 갈고 닦아 하나의 실에 꿰어 가장 빛나는 구슬로 만든 셈이다. 스미스의 도덕철학은 글래스고 대학 시절의 스승인 프랜시스 허치슨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스미스는 학생시절에 허치슨으로부터 도덕철학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후에 모교에서 허치슨의 자리를 이어 받아 도덕철학을 가르쳤다. 스미스는 허치슨으로부터 인간에 내재하는 도덕 감각(moral sense)에서 사회질서의 원리를 구하고자 하는 스코틀랜드의 학문적 전통과 도덕 감각이 인간의 선천적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경험론적 전통도 물려받았다. 허치슨은 도덕 감각을 철저하게 경험론적 시각에서 설명했다. 인간에게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는 감각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또한 아름답고 추한 것을 느끼는 감각(미 감각)과 좋고 나쁜 것을 느끼는 감각(도덕 감각)이 있다고 상정했다. 그는 이런 비유도 했다. 뜨거운 불에 화상을 입은 사람이 경험적으로 불을 멀리하는 것처럼, 사람은 경험적으로 자신에게 좋거나 아름다운 것에 가까이 하고 나쁘거나 추한 것을 멀리한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자기애(self-love) 또는 자기이익(self-interest)에 의해서 선(good)이라고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도덕의 원천이다. 그는 도덕 판단이 이성이 아니라 도덕 감각의 산물이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러한 허치슨의 주장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두 주역 데이비드 흄(David Hume)과 애덤 스미스에게 각각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더 나아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the greatest happiness for the greatest numbers)’을 원리로 하는 영국 공리주의의 씨앗을 뿌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남는다. 개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좋고 나쁘다는 판단을 내리는 최종 판관이 된다면, 공공의 이익 또는 공공선(commonly good)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이에 대해 허치슨은 인간은 상호승인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응답한다. 이 대목에서 허치슨은 이타심 또는 자선(benevolence)이라는 오래된 개념을 소환한다. 그는 자선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자선은 타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타적 행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해를 끼치는 않는 한도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자선이라는 것이다. 허치슨은 자선을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덕이라고 생각했으며, 공공의 이익으로 향하는 자선의 원리는 마치 중력의 원리와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흄과 스미스는 이 대목에서 이의를 제기한다. 흄은 도덕이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감정의 산물이라는 허치슨의 주장에는 동의한다. 쾌락 또는 고통의 감정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도 역시 동의한다. 그러나 흄은 자선을 바탕으로 한 개개인의 상호승인이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허치슨의 견해와는 달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자연적인 도덕적 승인이 아니라 인위적인 정의(justice)라고 주장했다. 인간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적 성향이지만, 개인의 충돌을 조정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공동 이익에 대한 일반 감각(general sense of common interest)’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공동 이익에 기초한 정의의 규칙이며, 이러한 정의의 규칙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감(sympathy)’ 때문이라고 했다. 물론 허치슨도 공감의 기능을 주장하기는 했다. 그러나 허치슨이 말하는 공감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흄이 말하는 공감은 공동의 이익에 대한 ‘효용(utility)’에 대한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허치슨의 도덕감각 이론이 공리주의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허치슨과 공리주의를 제창한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 사이에는 사상사적으로 흄이 제기한 효용 개념이 매개되고 있다. |